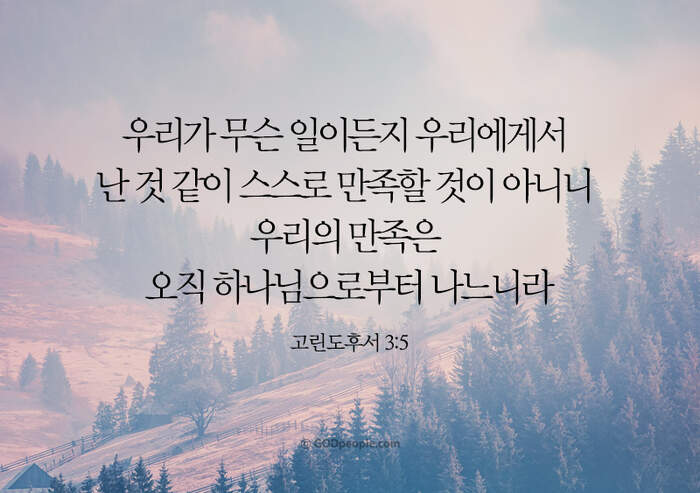인연 - 정직한 시간 / 이강순 숨이 턱에 차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 급기야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퍽 주저앉았다.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기댔는지 누웠는지 분간이 안 되는 무아지경의 상태였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는지조차 스스로 분간할 수 없는 무념의 상태라 해야 할까. 최악의 순간을 모면하는 그 순간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던 것 같다. 눈을 떴을 때 앞서 간 일행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낯선 이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지요?”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괜찮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았다. 괜찮다는 표현은 슬며시 일어나 배낭에 있는 물을 찾는 일이었다. 내가 미처 물을 꺼내기도 전에 앞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