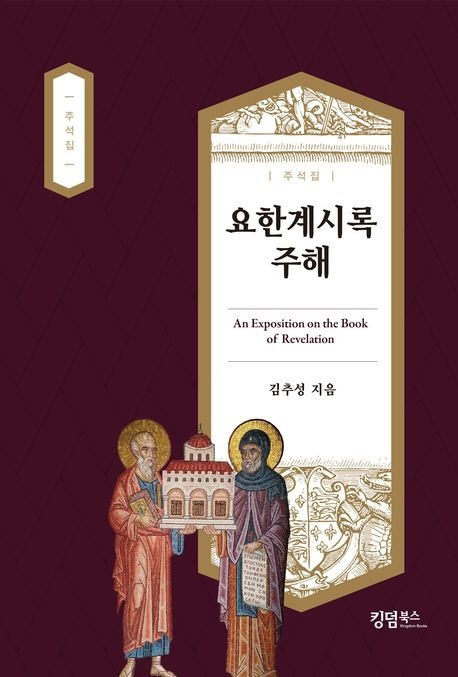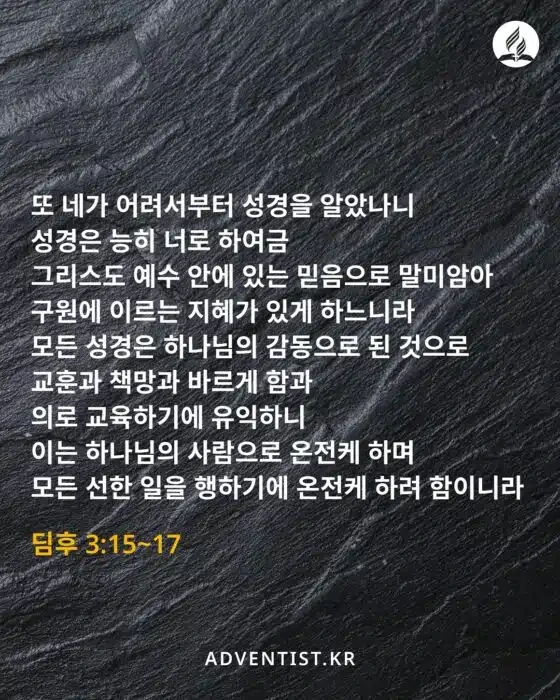우리 마을 앞 언덕에 초가 한 채가 있었다. 이 땅에서 일본 사람들의 그림자가 사라진 다음 해 봄이었다. 그 지붕에 난데없이 대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꽂혀 있었다. 가끔, 그 집 싸리나무 울타리에서 새어나오는 찬송가 소리가 아지랑이처럼 온 마을에 울려퍼졌다. 교인이라야 부인네 예닐곱, 초등학생 대여섯이었다. 대처에서 집사 노릇을 하던 분이 귀향하여 있다가 자기 집 대청에 차린 예배당이었다. 그 해 여름, 친구 따라 강남에 가듯이 나도 예수꾼이 되었다. 난생 처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도 들었다. 반세기가 지난 옛 일, 이제는 그 예배당의 뜰에 감나무가 있었는지 대추나무가 서 있었는지 아슬하고, 집사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는지 검정 목도리를 둘렀는지 감감하나, 오직 한 토막 추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