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은 여전히 기독교에 적대적일 뿐 아니라, 선명하게 다른 영역처럼 보인다.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사태에서 보듯, 교회 내에서도 성경 창세기 1장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창조론 vs 진화론’의 구도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듯 하다.
소위 유신진화론 지지자들은 창조과학 비판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세상 모든 일을 진화로 풀어내려는 ‘무신론 진화주의’와 관련 세계관의 확장에 대해선 정작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을 의아하게 만든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전자라고 선언하고, 신경과학자들은 두뇌 활동이라고 선언하며, 실리콘밸리 기술 이상주의자들은 ‘알고리듬(Algorithm)’이라고 선언해도 말이다.
“종교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만큼 과학에 대해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았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사실은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종교는 과학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학적 사상과 활동을 적법화하고 보존하고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과학을 지원했다.”
<마지스테리아>의 저자는 이처럼 오랫동안 (서양 역사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끊임없는 충돌이 아닌, 유익한 협력관계를 이뤘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양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은 교회 내에서도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역사는 길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외쳤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후대에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을 강등하거나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비주의 수도사이자 연금술사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는 자신의 과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화가 크리스티아노 반티(Cristiano Banti, 1824-1904)의 작품 ‘갈릴레오가 로마 종교재판소에 출두하다(Galileo facing the Roman Inquisition).’.
런던 왕립학회와 같은 초기 과학 학회들은 반(反)종교적이지 않았다. 뉴턴에겐 신학이 훨씬 더 중요했고, 과학보다 신학에 관한 글을 훨씬 더 많이 집필했으며, 그의 과학은 우주에서 신을 추방하지 않았다. 일반 상식과 달리, 계몽주의 시대는 과학과 종교가 조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시기다.
초기 지질학의 업적 중 많은 부분이 성직자들에 의해 이뤄졌고, 그들 대부분은 눈물을 너무 많이 쏟지 않고도 새로이 확장된 지구의 역사를 자신의 신앙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다윈은 (오직) 진화론 때문에 신앙을 잃었던 게 아니다. 더욱이 말년에는 진화론이 유신론과 양립할 수 없음을 부인했다.
특히 1633년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을 당한 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1860년 헉슬리는 새뮤얼 윌버포스 주교와의 진화론 논쟁에서 “주교의 자손이 될 바엔 원숭이의 자손이 낫겠다”고 말하진 않았다. 1925년 미국에서 스코프스의 소위 ‘원숭이 재판’은 진화론만큼 우생학의 문제였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종교가 힘으로 우위를 차지하지만 결국 과학에 모욕적으로 패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저자는 이 유명한 ‘전투들’ 안팎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관한 ‘단 하나의 역사’란 없다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단 하나의 역사’로만 알게 된 것은, 1874년 존 윌리엄 드레이퍼가 썼던 <종교와 과학 충돌의 역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의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 ‘하나님의 두 책(자연과 성경)’이라는 오래된 비유는 자연 탐구를 지지하는 강력한 논거가 됐고, 초기 근대 과학은 신학의 보호를 받아 존속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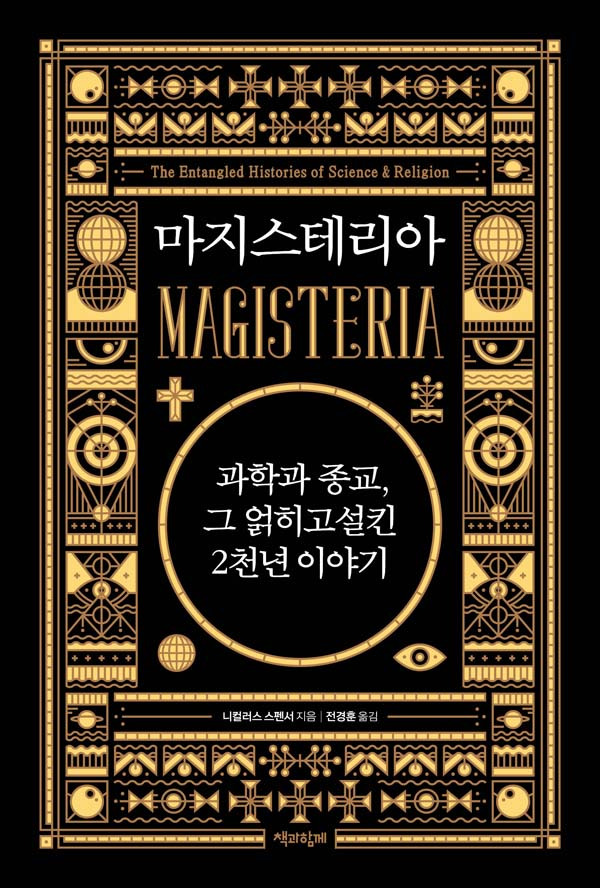
저자는 이러한 굴절됐던 역사를 바로잡아 가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본질과 권위에 관한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갈파한다. 과학과 종교의 역사는 곧,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의 여정이었다는 것이다.
역사를 관통해서 인간이 물질적 존재임을 과학이 주장할 때면 어떤 종교적 사상가들은 어깨를 으쓱 하고 어떤 종교적 사상가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인간이 ‘단지’ 물질적 존재일 뿐이라고 과학이 주장할 때는 모든 종교적 사상가가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고대 세계부터 오늘날까지 종교와 과학의 얼키고설킨 관계에 대해, 특히 종교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점철된 해석을 상세하고도 편견 없이 바로잡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간을 육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학과 종교가 더더욱 서로 대화를 멈추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 <마지스테리아(Magisteria)>는 ‘교도권(敎導權)’을 뜻하는 라틴어 마지스테리움(Magisterium)의 복수형이다. 스승을 뜻하는 마지스테르(Magister)에서 나온 이 말은, 가톨릭에서 복음 선포와 관련된 교황과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칠 권한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와 관련, 미국 유명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말년에 종교와 과학을 “서로 겹치지 않는 ‘마지스테리아(Non-overlapping Magisteria, NOMA)’”라고 선언했다. 둘은 서로를 침범할 필요도 없고 침범해서도 안 되는, 서로 구분되는 인간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앞에서 봤듯 “둘 사이의 경계는 깔끔하게 그어지지 않고, 둘의 영역은 제멋대로 뻗어나가며, 끝없이 매혹적으로 얽혀 있다”고 책을 통해 반박한다.
'설교, 기독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렌체의 양심과 영혼을 뒤흔들었던 설교자/한평우 칼럼 (0) | 2024.10.24 |
|---|---|
| 美 그래미상 가수 “기독교인이 세상의 타락과 싸우지 않으면 공범” (0) | 2024.08.24 |
| ‘한 달 사이에 기도원’ 10%만… 10년 새 크게 줄어 (0) | 2024.08.06 |
| “파리올림픽, 24억 기독교인들에 수치와 고민 안겨” (0) | 2024.07.30 |
| 조정민 목사의 9가지 잠언록으로 돌아보는 나의 모습 (0) | 202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