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쥐와 인간
대공황의 모진 바람에 땅을 잃은 일꾼들이 이 농장 저 농장을 전전하며 미래도 없는 삶을 이어간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노동을 하면서 인정조차 메말라버린 뜨내기들의 숙소에서 레니와 조지는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꿈을 키워간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어수룩한 거구 레니와 작지만 차돌멩이처럼 야무진 조지. 이 떠돌이 노동자들은 과연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신기루처럼 레니도, 둘의 미래도 사라진 자리에 조지 혼자 덩그마니 서 있다. 글 김지나 기자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빚은 리얼리즘 소설
인간이란 아는 것도 없이 알량한 지식에 기대 많은 것을 재단한다. 일종의 선입견이다.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의 작가 존 스타인벡. ‘존 스타인벡은 노동자 출신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미국 작가고, 그의 작품들은 미국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정도가 내가 아는 지식의 전부였다. 나의 이 알량한 지식은, 리얼리즘에 충실한 그의 작품이 무겁고 딱딱하고, 계급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날선 작품일 것이고, 따라서 틀림없이 지루할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생쥐와 인간>은, 나의 재단이 참으로 섣부른 것임을 통감하게 했다. 날카롭게 본질을 파고드는 그의 리얼리즘이 서민적인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휴머니즘적 문체로 색다른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는가.
1937년에 출간된 <생쥐와 인간>은 미국의 대공황(1929년) 당시, 캘리포니아의 샐리더스 지방을 배경으로 조지와 레니라는 떠돌이 일꾼의 고독한 삶과 좌절된 꿈을 그린 소설이다. 아이 같은 순수함을 지닌, 조금 모자란 레니와 그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작고 영리한 조지, 한때는 뛰어난 양치기 개였지만 이젠 늙고 병들어 쓸모없어진 개를 데리고 다니는 늙은 일꾼 캔디와 말에 차여 등이 굽은 외톨박이 마구간지기 흑인 크룩스, 솜씨 좋은 마부 슬림… 이들은 모두 ‘생쥐’보다 나을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었다. 스타인벡은 책의 첫머리에 로버트 번스의 시 <생쥐에게>를 옮겨놓았다.
하지만 생쥐야, 앞날을 예측해 봐야 소용없는 건/너만이 아니란다.
생쥐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일이 제멋대로 어그러져,
고대했던 기쁨은 고사하고/슬픔과 고통만 맛보는 일이 허다하잖니!
왜 책의 제목을 ‘생쥐와 인간’이라고 했는지 알게 해주는 이 시는, 소설을 다 읽은 후 다시 읊어보면 훨씬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참 대조적으로 보이는 레니와 조지. 이들은 앞날이 없는 다른 일꾼들과 다르게 소박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벅찬 순간을 맞기도 한다. 하지만 그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 소박한 미래에 대한 꿈도, 의지하며 살았던 레니도 사라진 자리에서, 조지가 통렬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Angry Thirties, 그리고 떠돌이 노동자들
샐리너스 강가의 솔대드는 캘리포니아 주의 한 도시다. 풍광이 아름다운 이곳에 두 사내가 나타난다. 둘 다 청바지와 놋쇠단추가 달린 청재킷 차림이었고 볼품없는 검은 모자를 쓰고 단단하게 돌돌 만 담요를 어깨에 지고 있었다. 우리의 주인공, 조지와 레니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행색은 당시 떠돌이 일꾼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들은 취업카드와 버스표를 쥐고 새로 일할 농장을 찾았다.
우리처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야. 가족도 없지. 어디에 속한 것도 아니지. 그냥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이 좀 모이면 읍내에 가서 다 날려버려. 그리고 너도 잘 알다시피 또 다른 농장에 가서 죽자고 일을 해. 도대체 앞날이란 게 없지.
조지의 이 한마디 말이 당시 떠돌이 일꾼들의 삶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청재킷에 담요를 메고 농장과 농장을 떠돌며 날품팔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아무것도 꿈 꿀 수 없는 떠돌이 일꾼으로 내몬 것은 1929년 대공황의 한파다. <생쥐와 인간>이 발표된 1930년대는 고통과 불만의 시대, 즉 ‘Angry Thirties(성난 30년대)’였다. 경제 대공황의 격동이 미국을 강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빈곤에 허덕이던, 절망의 시대였다.
게다가 대공황 이전에 갑작스런 농업의 기계화로 수많은 소작인이 일터와 보금자리를 잃고 유랑하는 노동자로 전락해 대도시 주변을 맴돌거나, 뜨내기 농장 일꾼이 되어 이 농장 저 농장 떠돌고 있었다. 또한 숨가쁘게 진행된 산업 자본주의 발달은 급격한 문화 변동을 야기해 사회적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일자리보다 실업자가 더 많았고, 실업자 수가 끝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떨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다.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인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토지를 중심으로 이웃과 가족이 평화롭게 공동체를 일구며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은 채 세상 밖으로 내몰렸다.소설은 이 뜨내기 일꾼들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숙소라고 해봐야 침대 한 칸과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과상자가 고작이다. 매일 매일 거친 농장일의 대가로 몇 푼의 주급을 손에 쥐면 읍내 술집에서 술과 노름, 여자를 사는 일에 다 써버린다. 떠돌이 일꾼들이니 동료애가 있을 리 만무하다. 어느 날 나타나 침대 한칸 차지하고 일하다 혼자 떠나버리는 부평초 같은 삶. 그러니 타인에게 신경을 쓰는 일 따위는 없다. 마음 붙일 곳도, 미래도 없이 떠돌다보니 심사가 꼬여 남을 믿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싸움질이다. 사람다운 삶은 찾아볼 수가 없다. 조지와 레니가 처음 농장에 왔을 때, 이 둘의 관계를 호의로 보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농장주 아들 컬리는 말할 것도 없고, 솜씨 좋고 우직한 마부 슬림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들을 이해하게 된다.
슬림의 눈은 조지를 꿰뚫어 그 너머를 보았다.
“함께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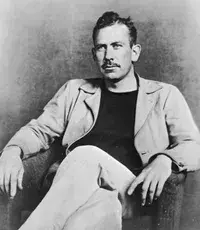
'리라책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국/중편 소설 노벨 문학상 수상/가와바타 야스나리 (0) | 2023.04.01 |
|---|---|
| 장편 소설 빙점/미우라 아야코 (0) | 2023.03.28 |
| 인물로 읽는 세계사 교양 수업 365 (0) | 2023.03.10 |
| 며느리/이무영 단편 소설 (0) | 2022.09.29 |
|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0) | 2022.07.13 |